오선민 시인의 서재입니다
발 없는 새 / 이제니 본문
발 없는 새
이제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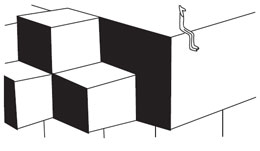
청춘은 다 고아지. 새벽이슬을 맞고 허공에 얼굴을 묻을 때 바람은 아직도 도착하지 않았지. 이제 우리 어디로 갈까. 이제 우리 무엇을 할까. 어디든 어디든 무엇이든 무엇이든. 청춘은 다 고아지. 도착하지 않은 바람처럼 떠돌아다니지. 나는 발 없는 새. 불꽃 같은 삶은 내게 어울리지 않아. 옷깃에서 떨어진 단추들은 다 어디로 사라졌나. 난 사라진 단춧구멍 같은 너를 생각하지. 작은 구멍으로만 들락날락거리는 바람처럼 네게로 갔다 내게로 돌아오지. 우리는 한없이 둥글고 한없이 부풀고 걸핏하면 울음을 터뜨리려고 해. 질감 없이 부피 없이 자꾸만 날아오르려고 하지. 구체성이 결여된 삶에도 사각의 모퉁이는 허용될까. 나는 기대어 쉴 만한 곳이 필요해. 각진 곳이 필요해. 널브러진 채로 몸을 접을 만한 작은 공간이 필요해. 나무로 만든 작은 관이라면 더 좋겠지. 나는 거기 누워 꿈 같은 잠을 잘 거야. 잠 같은 꿈을 꿀 거야. 눈을 감았다 뜨는 사이 내가 어디로 흘러와 있는지 볼 거야. 누구든 한번은 태어나고 한번은 죽지. 한번 태어났음에도 또다시 태어나고 싶어하는 사람들. 한번 죽었는데도 또다시 죽으려는 사람들. 제대로 태어나지도 제대로 죽지도 못하는 사람들. 청춘은 다 고아지. 미로의 길을 헤매는 열망처럼 나아갔다 되돌아오지. 입말 속을 구르는 불안처럼 무한증식하지. 나의 검은 펜은 오늘도 꿈속의 단어들을 받아적지. 떠오를 수 있을 데까지 떠올랐던 높이를 기록하지. 나의 두 발은 어디로 사라졌나. 짐작할 수 없는 침묵 속에 숨겨두었나. 짐작할 수 없는 온도 속에 묻어두었나. 짐작할 수 없는 온도는 짐작할 수 없는 높이를 수반하지. 높이는 종종 깊이라는 말로 오인되지. 다다르지 못한 온도를 노래할 수 있는가. 다다르지 못한 온도를 아낄 수 있는가. 우리의 대답은 언제나 질문으로 시작해서 질문으로 끝나지. 청춘은 다 고아지. 헛된 비유의 문장들을 이마에 새기지. 어디에도 소용없는 문장들이 쌓여만 가지. 위안 없는 사물들의 이름으로 시간을 견뎌내지.
언젠가 한국 닌텐도의 코다 미네오 사장의 인터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기자가 "닌텐도의 경쟁 상대는 누구입니까?"라고 묻자, 코다 사장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게임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대단한 자신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청춘의 가장 큰 고민 역시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춘에 대한 무관심.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 봐도 누구 하나 그들을 지켜보는 사람은 없으며, 젊을 때는 젊음을 모른다더니 심지어는 자신마저도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잘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춘이라고 말하면, 늘 목이 마르고 허기집니다. 외로움이 뭐냐고 묻는다면 목이 마르고 허기진 것과 같은 마음이라고 대답하겠어요.
'좋은 시 감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시계악기벌레심장 (외 1편) / 이수정 (0) | 2011.01.14 |
|---|---|
| 삼겹살 / 김기택 (0) | 2011.01.05 |
| 못 위의 잠 / 나희덕 (0) | 2010.12.26 |
| 명태 / 강우식 (0) | 2010.12.25 |
| 세속사원 / 복효근 (0) | 2010.12.22 |
